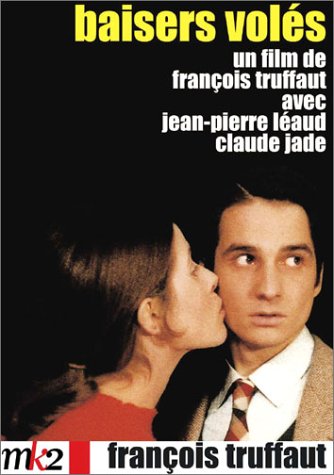돼지를 두 마리나 잡았다. 삼시 세끼 밥상에 고기국과 굴비, 나는 못 먹지만 홍어 삼합이 올라왔고
동네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싸주는 떡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나도 이모들, 삼촌들, 이모부들과 밤새 둘러앉아 엄마 아빠 눈치 보며
1.8리터 짜리 보해 소주를 끼고 필름이 끊기도록 마셔댔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당일에 부모님은 차를 타고 밤길로 떠나셨고,
나는 낮부터 핸드폰 배터리가 아웃이 된 채, 자정이 다 되어서야 귀가하여
비보를 듣고 내방 침대에 누워 벽을 붙잡고 울다 잠들었다.
효성 지극한 한 부부가 치매노인을 모시다가 똥,오줌 냄새가 배겨 더러운 장판을 새로 갈아드린 다음날,
노인은 돌아가셨다고 누군가의 편지에서 읽었었지...
엄마가 병원에서 받아온 할아버지의 약을 우체국에 가서 시골로 부치는 일은 내 몫.
월요일 아침, 우체국에 가서 잽싸게 약을 부쳤다.
진통제가 늦어 할아버지가 전날 잠 한 숨 못주무시고 쓰러져 있으셨다고했다.
제일 빠른 등기면 내일 오전 중엔 들어가리라.
화요일, 할아버지는 내가 부친 약봉투를 받아는 보고 운명하신걸까?
울다가 잠든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떠서야 눈이 퉁퉁 부어서 일어난 나는 막배 시간에 맞춰 진도까지 갈 수가 없어서
또 외가로 향하지 못했고, 셋째 날이 되어서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첫차를 타고 내려갔다.
땅끝 마을 해남을 지나 진도까지 여섯시간,
거기서 다시 팽목 선착장까지 버스를 타고 들어가 배표를 끊고
엄마의 고향인 섬으로 들어가는 페리호를 타고 바다를 밟는다.
그 섬에 도착해서 또 차를 타고 할머니 집이 있는 마을에 당도한다.
새벽 다섯시 반에 일어나서 부산을 떨었는데도 네시가 되어서야 할머니집 마당을 볼 수가 있었다.
대문도 없는 할머니 집 입구에 흩뿌려져 있는 흰국화 꽃잎들.
이미 상여는 나갔고 마당엔 술을 마시고 있는 동네 사람들뿐이다.
마당에서 둘러보면 바다와 산뿐이다.
선산을 찾아 산 하나를 넘었다.
벌써 할아버지는 땅에 묻히셨다. 이모들은 흙을 쥐고 울고 있고
엄마, 아빠는 먼길 나 혼자 찾아온 걸 보고 놀라신다. 엄마의 몰골은 말이 아니다.
눈물을 닦으며 묘소에 절을 올린다.
할아버지의 수년간에 걸친 간암 투병기는 그렇게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날씨는 봄날같았다.
서울로 돌아오기 전까지 외가는 그야말로 시끌벅적했다.
밥먹으러 오라는 방송이 자주 동네회관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왔고
동네사람들의 밥상을 차리느라 나와 이모들과 외숙모는 정신이 없었다.
술과 음료수 박스를 실은 트럭이 들락날락거렸고
아침마다 떡을 새로 했다.
삭힌 홍어냄새에 기절할 것 같았다. 그래도 술병이 지천에 깔려 기분은 좋았다.
오랜만에 만난 이모들 가족, 삼촌 가족들과 있으니 대그룹 회사원이라도 된 듯 했다.
피로 뭉쳐져 있는 느낌. 집에서는 매일 나를 갈구던 아빠도 외가에서는 너그러우셨다.
엄마는 장사를 해서 셈에 밝은 맏딸로,
상주인 삼촌을 제치고 조의금 장부 앞에 앉아 봉투 세기에 정신이 없으셨다.
나중엔 친척들을 다 불러모아 앉아 들어온 조의금을 각자의 지위와 역할을 따져 분배까지 하시더라.
(점보러 갔을때 ** 도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당신 어머니가 조금 더 배우셨다면 대한민국을 쥐락 펴락하는 큰 손이 되셨을겁니다.")
각종 방사선, 약물 치료를 위해 그 먼데서 원자력 병원에 가기 위해 서울에 오시면
칠남매 중 맏딸인 엄마가 모시게 되었고 늘 우리집 내 방에 머무셨던 할아버지.
컴퓨터도 며칠간 쓸 수 가 없고 잠도 편히 잘 수 없고, 할아버지의 밥상과 간식을 신경써서 차리는 것도
귀찮아 할아버지의 잦은 방문이 늘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
며느리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맏딸이라고 일만 디립다 시켰지,
부모로서 해준것도 없는 우리 엄마한테 늘 짐이 되는 할아버지는
싸가지없고, 부모를 무척 사랑하는 사리분별 잘 하는 내 동생에게는 늘 쌩깜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간호사인 동생은 할아버지께 링겔 주사 한번 꽂아드리지 않았다.
동생의 효심은 1촌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나는...... 그래도...... 나는 간에서 생긴 암세포들이 무릎뼈까지 내려가 기승을 부려
지난 달엔 목발까지 짚고 서울에 올라오신 모습을 보니
키도 엄청 크고 잘 생긴 할아버지의 옛모습과 비교가 되어
당신 사시는 퇴락한 어촌마을같이 느껴져 마음이 짠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언제나 외손주들에게는 너그러운 분들이 아닌가.
할아버지가 가시면, 할머니와 엄마의 상실감은 어쩌나 싶었는데
할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나서도 엄마는 서울로 오지 못하시고 할머니와 섬에 남으셨다.
할머니가 고인의 물건을 붙잡고 매일 울며 살것을 걱정하여
소각을 하거나 처분을 하실 작정이신것 같다.
토요일 아침, 섬마을에는 바람이 새차게 불기 시작한다.
늘 주위보가 떨어져 발이 묶일까봐 걱정하는 그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은
파도가 심해지기전에 배에 오른다.
아침 7시 반, 첫배를 타고 나와 아빠와 많은 친척들은 섬을 나선다.
그래도 저녁엔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다.
이제 일요일엔 하루 쉬고,
월요일엔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
며칠간의 시끄러운 축제는 마치 꿈이었던 것 처럼.
할아버지의 3일장이 끝난 다음 날, 서울에선 세째 조카가 태어났다.
어째꺼나...인생은 zero s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