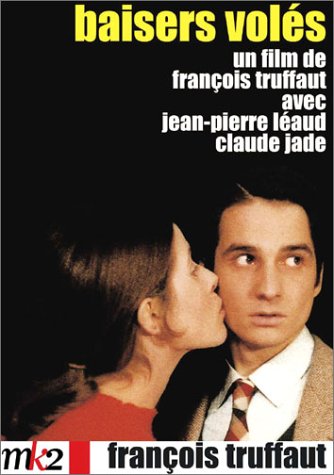원두막에서 옛일곱의 사람이 있었던 터라 밖의 주변머리를
돌아 보았다.
그런데 바로 아래에 남루할데로 남루한 헐궈진 개집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크기도 하여 개집이 커다랗게 느껴졌다.
녀석은 검고 짚은 브라운으로 얼룩 뒤범벅이었고 개집안에서는 생활을 하지 않았고 그 집아래에 손수 개발닥으로 파놓은 개집아래 땅굴에서 튀어나왔다.
두 귀는 무겁게 축 늘어져있고 머리는 내 가슴과 배꼽위까지 정도의 크기였다.
언제나 양 두다리를 튼튼히 선채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있었지만 그 눈빛과 눈매는 어린개 처럼 활동적이고 유난히 강렬했다.
늑대처럼 검은 홍채에 엷은 밤색의 동광이었던 개의 눈동자가 무서웠을 텐데 나는 무서워하지 않았다.
어릴때부터 개에 사죽을 못쓰고 개를 밝히는 개 중독자이여서
언제는 손목을 덮석 물렸었는데도 나는 개를 사랑한다.
그 개를 말없이 째려보고 그 개의 기에 눌리지 않으려고 개의 눈빛을 놓치지 않고 계속 쳐다보았다.
시선은 정신병자의 시선처럼 매 순간마다 바뀌고 혼란스러운 듯이 왔다 갔다 이리저리 흐름을 읽을 수 없었다.
두 양다리는 힘있게 땅을 밣고 있었는데 발톱이 길어서 나이가 들어보이기도 했지만 아주 싱싱하게 품어져 나오는 불끈 거리는 숨소리때문에 젊은 개처럼 보였다.
다른 소리나 움직임에 별다른 장난도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여자앞에서 개는 사고가 있고 계산된 듯하게 날 한 번 보고 다른 곳을 보고 또는 앉았다가 번 발치를 보고 다시 나를 보고 했다.
숫놈인지 암놈인지가 궁금해서 머리를 옆으로 숙여서 밒을 보려고 했는데 한두개의 튀어나온 젖탱이를 확인하고서야 이 놈이 암놈이라는 것을 알았다.
암놈의 짐승일뿐 그 무엇에 의해 길들여지지 않은 혁혁하고 드 높은 기상의 몸매는 자연의 아름다움이었다.
그 무엇에 노예가 되고 길들여지는 것은 아주 추악한것이기 때문에 그 개가 비록 시골에서 흔한 똥개일지라도 나는 우러러 사랑하는 맘이 들었다.
지금도 살아지지 않고 내 기억 언저리에 남아 있어 신선했던 개의 눈빛은 뜨거운 오후의 폭염처럼 계속 내리 쬐이고 있는 것 같다.
내 혼에도 그 느낌이 전달되여서 한 번 두번 쳐다 본것 뿐인 개의 눈빛이 나를 향할 때마다 나는 깜짝 놀랬다.
그 깜짝이라는 것은 심장이 멈출 것 같은 순간적인 심장 멈춤이 왔다는 것이다.
아마도 개가 나의 혼을 본것이 분명하다.
그 개는 귀신도 본다는 영물같았다.
개의 나이를 주인에게 물으니 일곱살이라고 했다.
사람앞에서 침착하고 정신 없이 길들여 지지 않은 눈빛..
파리 떼가 윙윙 거리니 퍽퍽 소리대며 입 벌리고 다무는 소릴 내며 잡아대는 것이 터프했다.
잔 재주나 피고 가벼운 말재간에 금방 반응하고 추악한 냄새를 풍기는 인간하고는 다른 이런 개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